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옳다
훌륭한 손재주가 대물림된 이 집에선 종이접기면 종이접기, 만들기면 만들기, 그리기면 그리기, 어느 하나 막힘없이 뚝딱 이루어진다. 팽이가 팽글팽글 돌고 조각배가 또르르 떠내려가면 아이들의 웃음이 까르르 터진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니 이윽고 소매를 걷어 올린 어른들이 아이들 옆에 엉덩이를 깔고 앉는다.?
- 이미숙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06.28
- 댓글 0

아이들이 펼치는 상상력은 끝이 없다. 아이들의 대화를 듣다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말은 어디서 배운 거야? 혹시 내 아이는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부모라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 때 그런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어른들은 바쁨을 핑계로, 혹은 더 나은 교육을 핑계로 ‘놀아줄 의무’를 책으로, 어린이집으로, 문화센터로, 키즈카페로, 놀이공원으로 미루곤 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이와 함께 노는 법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을 몰랐던 게 아니었을까?
아이와 부모의 시간이 만나고, 서로 다른 두 시간이 하나로 합쳐지는 공간, 집. 때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때로는 세상이 멈춘 것처럼 천천히 흘러가는 아이들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집, 북촌의 네버랜드.
이 집에서는 누구도 시간을 재촉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이 집에만 가면 아이들은 눈이 커지고, 숨이 가빠지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촛불 두 개를 켜놓고 그림자 연극을 하는 날이면 좁은 마당은 구경온 동네 꼬마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집과 다르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이 집과 금방 사랑에 빠진다. 과연 비밀은 무엇일까?
지난 2005년 바람이 선선해지던 가을. 저자 서채홍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는 첫째 지원이, 뱃속에 곧 태어날 둘째를 품은 아내와 함께 북촌 한옥마을에 터를 잡았다. 오래된 한옥, 구불구불한 골목길, 담장 너머로 훌쩍 자라난 나무들…. 이 마을에는 그의 가족이 원하던 조용함, 도시의 소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차분함이 있었다.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그해에 엄마 뱃속에 있던 둘째 민준이는 늠름한 소년으로 자랐고, 형의 옆에선 막내 민겸이가 동네 친구들을 불러모은다. 여기는 북촌의 네버랜드, 부부와 세 아이가 함께 사는 집이다.
<북촌의 네버랜드>는 조용한 마을 북촌, 그 안에 있는 작은 한옥에 사는 한 가족이 만들어낸 유쾌한 파장을 담고 있다. 숲에서 주워온 나뭇가지로 장난감을 만들고 열매로 연하장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 집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누구든 대문을 두드리면 마루에 걸린 그네와 건넛방을 가득 채운 트램펄린에 오를 수 있다.
그 사이 집 안에 이야기가 쌓인 만큼 아이들은 키가 자라고 마음이 튼튼해졌다. 네버랜드의 작은 마당에서 시작된 이 가족의 이야기가 골목길 구석구석으로 번져 이웃을, 마을을, 동네 공원을 채워나가는 모습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사는 동네도 네버랜드로 변하는 마법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아이는 갖고 싶은 장남감이 있을 때면 아빠를 부른다. 때론 아빠가 먼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뚝딱 만들어 나타나기도 한다. 쿵, 짝, 손뼉이 잘 맞는 이 가족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러고 보니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건 이 집안의 내력이었나 보다.
저자가 어렸을 때, 삼촌은 낫 한 자루로 팽이와 배, 얼레 등을 뚝딱 만들어주셨고, 당숙은 철사와 배추망으로 곤충 채집망을 만들어 쓰셨다.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지은이는 배운 그대로를 아이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훌륭한 손재주가 대물림된 이 집에선 종이접기면 종이접기, 만들기면 만들기, 그리기면 그리기, 어느 하나 막힘없이 뚝딱 이루어진다. 팽이가 팽글팽글 돌고 조각배가 또르르 떠내려가면 아이들의 웃음이 까르르 터진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니 이윽고 소매를 걷어 올린 어른들이 아이들 옆에 엉덩이를 깔고 앉는다.
그런데 장난감을 만드는 과정이 어딘지 익숙하다. 주변 사물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재료를 찾고, 그 재료를 모아 가위와 끈 등 익숙한 도구로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 꼭 맥가이버가 하는 일과 닮았다. 아빠와 아이는 대장 맥가이버와 꼬마 맥가이버가 되어 이번 주말에도 삼청공원 숲 구석구석을 탐험한다. 이윽고 저녁, 마당에 둘러앉은 이들은 재료와 도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장난감을 만든다.
다시 쿵, 짝, 손뼉을 몇 번 마주치니 새총과 부메랑, 활과 쌍절곤, 조각배와 3D 입체안경이 완성된다. 다 만든 장난감을 들고 달려 나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오니 또 하루가 충만해진 기분이다. 누구나 이 과정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책 속에 여러 가지 장난감을 만드는 법과 도면을 수록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생활에 기다림을 더하니 조금 특별한 가족이 됐다. 남과 조금 다른 세상은 장애를 가진 첫째 아이와 함께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둘째를 낳고 셋째를 키우며 다름에 조금씩 익숙해졌고, 북촌의 좋은 이웃과 꼬마 친구들을 사귀며 하루하루를 채울 수 있었다.
부모는 시계를 아이의 시간에 맞추었다. 더디게, 때로는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첫째 지원이의 시간이 제 속도대로 흘러가기를 기다려고다. 아이가 늘면서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했다.
세 아이의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주어야 할지, 민준이와 민겸이가 지원이의 시간을 함께 기다려줄 수 있을지 잠시 걱정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는 않을지 두려웠던 적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부모의 걱정이 기우라고 말해주었다. 특히 이 가족의 산책길 풍경은 다섯 사람이 서로의 시간에 자기 시계를 맞추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엄마와 아빠가 누나의 양팔을 끼고 천천히 걷고 있으면 저만치 달려 나간 두 동생은 어딘가에 멈춰 서서 나머지 가족이 곁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두 동생은 친구들과 함께 놀 때나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갔을 때도 누나의 걸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때로는 누나의 등에 두 손을 대고 힘껏 밀어준 아이들. 네버랜드의 다섯 식구는 오늘도 북촌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보듬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동화를 쓰고 있다.
Copyright © 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 gdaily4u@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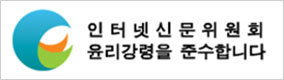
![[크기변환]지데일리 도시논객.jpg [크기변환]지데일리 도시논객.jpg](http://gdaily.kr/data/editor/2402/thumb-20240202122648_0156629ba446332a2b321c628dd2eaac_wsvw_190x143.jpg)
![[신간 산책] 생태학자 부부의 육아법.. 김우성 '생태활동가, 청년 김우성의 기후숲' [신간 산책] 생태학자 부부의 육아법.. 김우성 '생태활동가, 청년 김우성의 기후숲'](http://gdaily.kr/data/file/news/thumb-30690922_tHUiRy3l_e883f8da3fcf88c3d199d357ca62a6cf345fa338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