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산책] 너 정체가 뭐니?.. 댄 야카리노 '나는 이야기입니다' 外
- 손유지 press9437@gmail.com
- 등록 2023.06.25
- 댓글 0
![[크기변환]지데일리.JPG](http://www.gdaily.kr/data/editor/2306/20230625214009_fd5a4323944effa3244998fed851dfaa_m8ai.jpg)
나는 이야기입니다
댄 야카리노 지음, 유수현 옮김, 소원나무 펴냄
상상력 넘치는 판타지 영화나 심오한 내용을 담은 소설,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연극만이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겪는 모든 것이 ‘이야기’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녀가 다시 부모가 되어 ‘이야기’를 들려줬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을 살아가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겪은 것들을 말로, 그림으로, 글로, 사진으로 표현할 때 그것은 ‘이야기’가 된다. 이 책은 선사 시대의 동굴 벽화부터 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 사람들이 왜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까지 ‘이야기’의 끊임없는 역사를 담고 있다.
놀랍게도 ‘이야기’가 언제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한때는 검열돼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거나, 불에 태워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여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서 재미를 찾고, 감동하며 때론 무서움을 느끼기도 한다.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제와 독일 나치의 히틀러는 ‘이야기’의 힘을 두려워해 책을 태워 버리기도 했다. 그만큼 ‘이야기’는 사람의 감성과 생각을 자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책의 저자는 30개 이상의 그림책을 내며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그림책 작가다. 책의 일러스트는 붓으로 그린 듯, 강약 조절이 잘 된 선과 원색에 가까운 강한 색들이 잘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또 ‘이야기’의 다른 모습인 작은 새를 그림책에 배치하고 있다. 이 새는 변하지 않고 계속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표현하며,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다.
![[크기변환]지데일리.JPG](http://www.gdaily.kr/data/editor/2306/20230625213848_fd5a4323944effa3244998fed851dfaa_l360.jpg)
스토리 설계자 - 장르불문 존재감을 발휘하는 단단한 스토리 코어 설계법
리사 크론 지음, 홍한결 옮김, 부키 펴냄
미국 남부 문학의 대가 플래너리 오코너는 말했다. “스토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직접 써 보면 모른다는 걸 알게 된다.” 언뜻 맞는 말 같지만 오코너가 놓친 게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스토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대부분 스토리를 ‘플롯’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복잡한 사건들로 점철된 거대한 플롯만 있고 독자를 끌어당길 만한 스토리는 없는 글이 탄생하고 만다. 더딘 퇴고와 오리무중 결말은 덤이다. 지금이라도 글쓰기를 방해하는 스토리에 관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스토리의 본질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플롯이라는 겉모습에 숨겨진 진짜 ‘속 이야기’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
“글을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비우고 자리에 앉아 무작정 쓰는 것이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 본 말일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실천하는 글쓰기 법칙이기도 하다. 빈 종이를 바라보던 막막함은 점차 해방감으로 바뀐다. 얽매일 게 없으니 이대로 창의성의 고삐를 확 풀어주면 흥미로운 스토리가 '짜잔' 하고 나타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몇 페이지 못 가서 길을 잃고 만다. 그 이유는 ‘맥락’이 없기 때문이다. 의미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맥락’은 드러나지 않은 ‘과거’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작정 써 나가면 시작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맥락 없는 마구잡이 결말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
초고는 원래 형편없다지만, 진짜 스토리가 담겨 있는 형편없는 초고와 아무렇게나 마구 쏟아 놓은 형편없는 초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작가가 모든 밑그림을 그려 놓고 글을 써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대상이 외적인 ‘플롯’이 아닌 내적인 ‘스토리’여야만 한다. 주인공이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플롯부터 짜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진짜 힘들고 운명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쓸 참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도 전혀 몰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에겐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가 고민될 때 꺼내 쓰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 흔히 ‘영웅 서사 구조’로 대표되는 스토리 구조 모형이다. 그런데 이런 모형들은 영웅의 내적 투쟁을 암시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투쟁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마치 남녀 공용 프리사이즈로 나온 ‘시련’이라는 틀 안에 어떤 영웅이든 집어넣으면 된다는 듯, 사건들의 순서 자체에만 주목할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스토리 구조 모형이라기보다는 ‘플롯 구조 모형’에 가깝다. 틀에 맞춰 글을 쓰는 것은 형식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글이 되기 십상이다.
1억 부가 넘는 판매고 덕에 편집장부터 물류 창고 직원까지 연말 보너스로 5000 달러씩 받게 만든 전설의 책이 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3부작이다. 그런데 소위 대박 난 이 작품을 두고 글이 아름답다거나 잘 썼다는 평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글은 지지리도 못 썼는데,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여기엔 글의 질이 아닌 ‘뭔가’가 있는 게 틀림없다. 바로, 독자를 흠뻑 빠져들게 만드는 ‘스토리’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인간의 뇌는 서정적인 문체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잘 쓴 문장이나 시적인 표현으로 독자를 매료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포장지를 선물로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름다운 글의 힘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스토리의 힘’이다.
앞서 말한 스토리에 관한 오해들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플롯, 아름다운 문장, 기발한 구조 등 ‘겉으로 보이는 것 그 자체를 스토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스토리의 겉이 아닌 코어, 즉 ‘속 이야기’다.
플롯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주인공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내적 투쟁’이 잘 그려져야 한다. 아무리 잘 만든 열차도 전력을 공급하는 ‘전깃줄’이 없다면 제자리에서 꿈적하지 않는 것처럼 스토리 역시 주인공의 내적 투쟁이 없다면 독자에게 닿을 수 없다.
저자는 바로 이 ‘속 이야기’ 설계에 필요한 핵심 도구 6가지(만약에, 누구, 왜, 세계관, 원인과 결과, 언제)의 쓰임을 구체적으로 알려 준 다음, 그 도구들을 활용하여 스토리 장면 카드를 만들며 이야기의 밑그림을 그려나간다. 실제 한 작가의 사례를 통해 날 것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독자의 마음을 훔치는 스토리가 되는지 그 과정을 세세히 보여 준다.
Copyright © 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 gdaily4u@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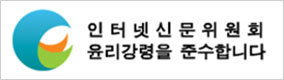
![[크기변환]지데일리.jpg [크기변환]지데일리.jpg](http://gdaily.kr/data/editor/2404/thumb-20240420082213_9ee9a4a7f9e5d1566cf38156cc48bbe6_qxvf_190x143.jpg)
![[크기변환]지데일리 도시논객.jpg [크기변환]지데일리 도시논객.jpg](http://gdaily.kr/data/editor/2402/thumb-20240202122648_0156629ba446332a2b321c628dd2eaac_wsvw_190x143.jpg)
![[신간 산책] 생태학자 부부의 육아법.. 김우성 '생태활동가, 청년 김우성의 기후숲' [신간 산책] 생태학자 부부의 육아법.. 김우성 '생태활동가, 청년 김우성의 기후숲'](http://gdaily.kr/data/file/news/thumb-30690922_tHUiRy3l_e883f8da3fcf88c3d199d357ca62a6cf345fa338_190x1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