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닌 예술
[GSEEK in BOOK] 조채영 '법 앞의 예술 - 예술 뒤 숨겨진 저작권 이야기'
- 이은진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08.27
- 댓글 0
근현대에 들어서 결국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조정하는 데에 법은 마지막 자리를 지킨다. 그래서인지 ‘법=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근간이 된 역사적 사건들도 법의 판단으로 종결되어 정리된 바 있다. 어떤 의미에서 법은 절대적이며, 최종적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잘못된 해석마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만큼 법은 강력한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지키고 따르는 일은 시민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법 앞의 예술>은 그러한 법의 가치 아래 놓인 ‘예술의 현실’과 ‘작가의 양심’을 묶어 생각해보는 책이다.
저자의 말처럼 ‘법서 같지 않은 법서’를 지향한 이 책은 저작권 실무에서 필요한 정답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저작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판단하기 앞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은 법과 상식의 괴리를 의미있는 소재로 다룬다.
법의 목적은 각 개인의 이익과 꼭 부합하지 않는다. 법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 또한 온전해야 한다. 개인과 사회의 공존을 위해 법이라는 균형추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 책은 예술과 인간을 둘러싼 법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그 질문은 어떤 법도, 법을 집행하는 인간도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비판적 검토에서 출발한다. 가난한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애초 ‘앤여왕법’으로 저작권법이 탄생한 이유가 작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출판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판매에 따른 합당한 이익을 가져간다는 지극히 정당한 원리가 신인작가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 창작활동은 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예술을 법으로 판단할 때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부재할 수 있다는 생각, 아름답다는 것만으로 완전한 예술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법률은 조항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법률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법관에 의해 생명을 갖게 된다. 저작자들은 책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사진을 찍는 행위를 통해 예술을 이해하고, 법관들은 법을 통해 예술을 이해한다. 저작권법은 예술가와 이용자 모두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모두에게 조금 불만족스러운 상태야 말로 합리적인 결과일 수 있다.
저작권법의 역사를 살피면 지금까지의 저작권은 ‘저작권 보호’의 목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지만, 저자는 지나친 저작권 보호가 오히려 문화 예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이는 예술의 본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패러디’나 ‘오마주’ 등과 같이 예술과 예술 사이에서 다시 새로운 예술이 시작되고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보편화한 시대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팝아트의 선구자 리차드 해밀턴이 잡지를 오려붙인 작품을 발표했을 때 ‘잡지 속 이미지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됐다면 팝아트는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자의 견해처럼 첨단 정보가 공유되는 요즘, 법의 관점을 통해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Copyright © 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 gdaily4u@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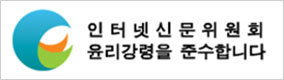
![[크기변환]지데일리.jpg [크기변환]지데일리.jpg](http://gdaily.kr/data/editor/2404/thumb-20240420082213_9ee9a4a7f9e5d1566cf38156cc48bbe6_qxvf_190x143.jpg)
![[크기변환]지데일리 도시논객.jpg [크기변환]지데일리 도시논객.jpg](http://gdaily.kr/data/editor/2402/thumb-20240202122648_0156629ba446332a2b321c628dd2eaac_wsvw_190x143.jpg)
![[신간 산책] 생태학자 부부의 육아법.. 김우성 '생태활동가, 청년 김우성의 기후숲' [신간 산책] 생태학자 부부의 육아법.. 김우성 '생태활동가, 청년 김우성의 기후숲'](http://gdaily.kr/data/file/news/thumb-30690922_tHUiRy3l_e883f8da3fcf88c3d199d357ca62a6cf345fa338_190x1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