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세상에 이름 없는 이는 없듯이, 이름 없는 제품도 없다. 물론 모두가 브랜드 네임을 갖지만, 모든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에도 수천수만 개의 브랜드가 생겼다 사라지는 치열한 현실과는 무관하게 명품 브랜드의 승승장구는 팬데믹의 와중에도 눈부시다. 이유는 자명하다. 바로 모방할 수 없는 서정과 서사를 간직했기 때문이다. 아름답지 않고, 스스로의 서사를 갖지 못한 브랜드는 어느 시대건 그저 왔다가 사라질 뿐이었다.
<서정과 서사로 읽는 브랜드 인문학>이 주목하고 있는 것 역시 브랜드를 관통하고 있는 서정적 미학과 서사적 스토리텔링이다.
우리가 알고있는 명품 브랜드들은 모두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스토리는 없다. 시간을 두고 대를 이어, 마치 리좀(덩이식물의 뿌리) 처럼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형태로 그들만의 서사를 형성하고 있다.
브랜드의 범위는 특정 제품 뿐 아니라 무형의 문화까지 확장된다. 가장 오랜 근원으로는 헬레니즘과 기독교마저도 브랜딩화 돼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됐으니 말이다.
이 책의 관점은 브랜드 자체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과 이를 욕망하는 개인의 욕구를 담담히 객관화하는 것으로 나뉜다.
브랜드와 그 상징인 로고는 '가치(Value)'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합의(Consensus)의 결과물이다. 합의가 없으면 가치도 없다. 아마존의 원시부족에게 명품가방은 그저 채집을 위한 망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과시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 욕망이 충족된다.
결국 명품의 조건이란 타인이 욕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크 라캉의 거울 이론을 빌자면, ‘나는 내가 욕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타인이 욕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한 거울 속의 나를 욕망’하는 것이다.
<어린왕자>의 장미와 여우처럼, 우리는 어쩌면 명품이라는 존재에 길들여진 채 타인의 욕망에 나를 투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 ‘취향과 클래스를 공유하는 은밀한 희열’을 멈출 수가 없다.
예술과 기술이 하나였던 시대, 아트(Art)라는 공통의 어원에서 태어난 장인은 아르티잔(Artisan), 예술가는 아티스트(Artist)라 불렸다.
시간이 흐른 후 칠장이는 화가가, 석공은 조각가가, 금은 세공업자는 금속공예가가 되고, 재봉사는 오트쿠튀르의 디자이너가 됐다.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 단순한 상품이 아닌, 작품인 이유다. 명품이라 불리는 것들은 바로 그 작품 위에 존재한다.
![[크기변환]g.jpg](http://www.gdaily.kr/data/editor/2011/20201128221022_aababd02c6226e9d4211e0c6a6134190_bxj4.jpg)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명품을 소비하며, 왜 유럽은 브랜드에 강한지, 왜 우리에게는 명품 브랜드가 없는지 한번쯤 의문을 품어봤을 것이다. 프랑스 인문학자이자 르네상스에 관한 한 국내에서 가장 정통한 저자는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한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현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리에게 명품 브랜드가 없는 이유는, 전쟁 후 명품 브랜드가 될 만큼 탄탄한 서사를 쓸 시간이 없었던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명품 브랜드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100년의 서사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솜씨하면 남부럽지 않은 장인들의 세계가 있었지만, 자신을 인정할 줄 모르고 자존감이 없는데 세계가 알아줄 리 만무하다는 일침이 아프게 남는다.
Copyright © 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 gdaily4u@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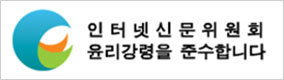
![[크기변환]지데일리.jpg [크기변환]지데일리.jpg](http://gdaily.kr/data/editor/2404/thumb-20240420082213_9ee9a4a7f9e5d1566cf38156cc48bbe6_qxvf_190x143.jpg)
![[크기변환]지데일리 도시논객.jpg [크기변환]지데일리 도시논객.jpg](http://gdaily.kr/data/editor/2402/thumb-20240202122648_0156629ba446332a2b321c628dd2eaac_wsvw_190x143.jpg)
![[신간 산책] 생태학자 부부의 육아법.. 김우성 '생태활동가, 청년 김우성의 기후숲' [신간 산책] 생태학자 부부의 육아법.. 김우성 '생태활동가, 청년 김우성의 기후숲'](http://gdaily.kr/data/file/news/thumb-30690922_tHUiRy3l_e883f8da3fcf88c3d199d357ca62a6cf345fa338_190x143.jpg)